 강지은
강지은
[한국심리학신문=강지은 ]
“오늘 아무것도 안 했더니 괜히 찝찝하고 불안하네.”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가? 요즘 많은 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무엇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일이나 학업 외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래도 괜찮은 걸까?”를 묻는다. 이처럼 성과 중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취가 없는 자신을 불안해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휴식에도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 성취 중심 사회
현대인들이 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근면한 태도 때문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자존감(Conditional Self-Esteem)’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만 자존감을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 경쟁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해야 칭찬받는다”, “성적이 좋아야 사랑받는다”는 식의 조건적 메시지를 내면화하면서 성장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데시(Edward Deci)와 리처드 라이언(Richard Ryan)이 제시한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간의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한다. 내재적 동기는 즐거움이나 의미, 자율성에서 비롯되며,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 경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성과 중심 문화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점차 사라지고, 외재적 동기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좋아서 하는 일’보다는 ‘성과가 나와야만 하는 일’에 몰입하게 되며, 쉬는 시간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경향은 완벽주의 성향과도 연결된다. 심리학자 폴 휴잇(Paul Hewitt)과 고든 플레처(Gordon Flett)는 ‘성과지향적 완벽주의(Achievement-oriented Perfectionism)’가 만성적인 자기비판과 만족 불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목표를 달성해도 그 순간만 잠시 안도할 뿐, 곧바로 “이제 다음은 뭘 해야 하지?”라는 압박이 시작된다. 결국, 끊임없는 목표 추구 속에서 우리는 지치게 되고, ‘멈춘 나’에 대한 수치심이 깊어진다.
이와 함께 현대인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기를 평가한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가 주장한 ‘사회적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SNS 속 끊임없는 성공 사례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쉼을 ‘게으름’으로 전환시킨다. 내가 쉴 때 남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을 강화시킨다.
삶의 필수 요소인 휴식
성취 중심의 삶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빠질 위험이 크다. ‘타버리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 일이나 과제에 지나치게 몰두한 결과,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겪는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뜻한다. 잠깐의 휴식을 피한 대가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오히려 계획했던 모든 일을 놓아버리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동기 상실과 자기 혐오로도 확장될 수 있다. 성취를 멈추는 것이 두려워 쉴 수 없었던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놓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처럼 성과 중심의 문화는 인간의 내면을 점점 병들게 한다. 생산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회, 휴식에도 자격을 요구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결과나 성과 이전에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이고, 삶의 필수 요소다.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보다 뒤처졌다고 해도 무의미하지 않다. 나를 긍정하는 기준이 외부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잠시 쉬는 것은 전혀 죄책감 느낄 일이 아니다.”
참고문헌
1) 한겨레, [Website], 2024, ‘휴식 없는 열정’ 번아웃, 당신이 약해서 오는 게 아냐 [건강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hanihealth/healthlife/1170999.html
2)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3) Deci, E. L., & Ryan, R. M. (1995).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31–49). Springer.
4)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5)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120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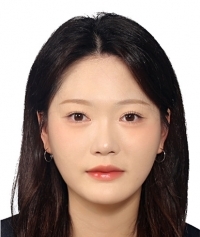
kje07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