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희
이창희
[한국심리학신문=이창희]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까?"
우리는 항상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첫사랑과 함께했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기억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때로는 야속하게 금방 끝나고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럼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소개팅도 다니고 이성을 만나는 노력을 한다. 이때 소개팅 자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여도 내가 이 친구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첫사랑과 잊을 수 없던 추억과 주체할 수 없이 벅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이 이 사람에게 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연애 중에도 마찬가지다. "전 애인은 이런 일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온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혹은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깊은 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문득 떠오르는 이 비교의 유혹. 현재 연인과의 말다툼 후에는 전 애인의 장점이 갑자기 선명해지고, 새 연인과 행복할 때는 전 연애의 불행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매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런 비교는 단순한 나쁜 습관일까, 아니면 우리 뇌의 필연적인 작동 방식일까?
첫사랑의 그림자는 종종 현재의 연애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그 비교의 순간, 우리는 과연 현재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라는 필터를 통해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저울질하게 만드는 우리의 비교 행동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이해해 보자.
선택적 기억의 함정: 확증 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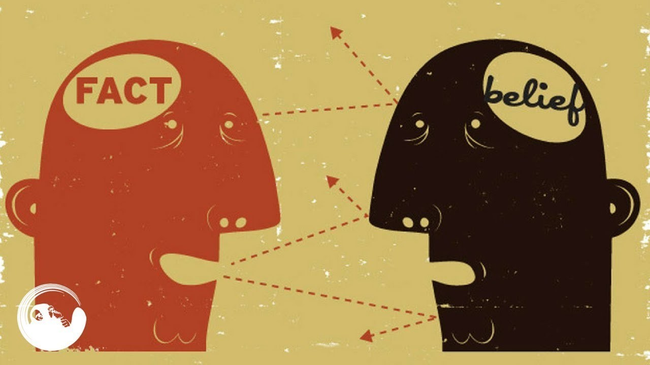
"전 남친은 한 번도 내 생일을 잊은 적이 없는데..."
피터 웨이슨(Peter Wason)의 “확증 편향” 이론은 우리가 현재 감정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심리학적 현상은 1960년대 웨이슨의 실험에서 처음 증명됐다.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 현재 연인과 싸웠을 때, 뇌는 즉시 '전 애인은 더 나았어'라는 생각을 뒷받침할 기억을 찾아낸다. ‘전 애인은 내 말을 더 잘 들었지', '전에는 이런 다툼이 없었어’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웨이슨의 실험대로, 우리는 현재 감정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찾는다.
반대로 지금 연애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뇌는 과거 연애의 부정적 측면들을 찾아낸다. ‘전 애인은 약속에 늦었지! 그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안정적이야’ 같은 생각이 든다. 같은 과거 연애인데도 현재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현재 감정을 지지하는 기억만 적극적으로 찾는 정보 탐색 편향을 가질 수 있다. 또 같은 상황도 현재 기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정보 해석의 편향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 이어 현재 관계가 좋으면 과거 연애의 단점을, 현재 관계가 힘들면 과거 연애의 장점을 더 잘 기억하는 기억 회상 편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이런 확증 편향의 결과다. 첫사랑의 강렬했던 감정만 기억하고, 그 관계의 단점은 잊어버린 채 현재 관계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저울: 상호의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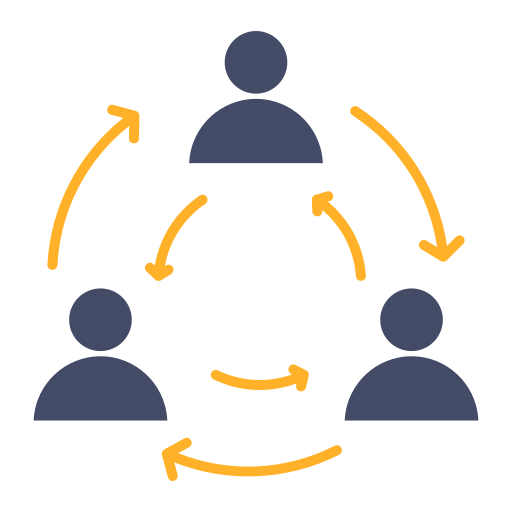
해럴드 켈리(Harold Kelley)와 존 티보(John Thibaut)의 “상호의존성 이론”은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기준으로 현재 관계를 판단한다.
먼저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연애에서 최소한 기대하는 것의 비교 수준을 통해 판단한다.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첫사랑의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차분한 감정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또한 ‘다른 선택지는 어떨까?’라는 대안 비교 수준에 따라 판단한다. 과거 연애, 친구들의 관계, 혹은 혼자 있는 상태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재 관계가 이런 대안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약해진다.
켈리와 티보의 이론은 우리가 연애를,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과거와 타인의 연애라는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관계의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과거 관계의 미화된 기억과 비교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비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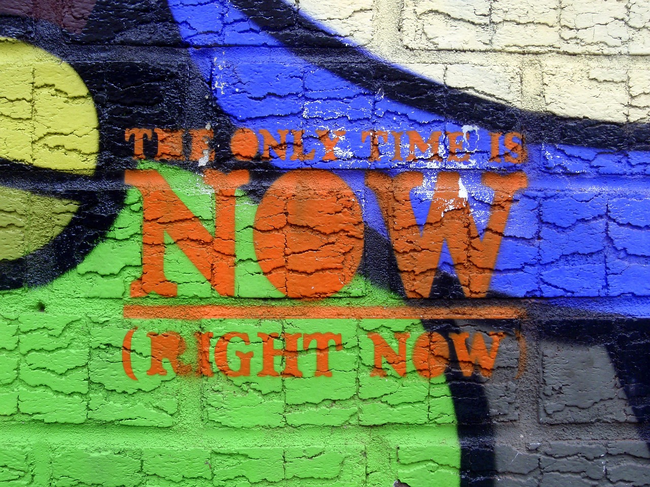
확증 편향과 상호의존성 이론이 보여주듯, 과거와 현재 연애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 작용이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와의 비교가 아닌, 현재에 대한 성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사랑의 설렘과 현재 연애의 편안함은 서로 다른 사랑의 형태일 뿐, 어느 하나가 더 진실한 것은 아니다.
사랑의 정의를 재탐구할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설렘 중심의 사랑, 안정감을 주는 사랑, 성장을 돕는 사랑... 이 모든 형태가 각자의 가치를 지닌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관계가 가진 고유한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완벽한 연애란 없지만,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상 사이에서, 진정한 연애의 기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참고문헌
1) 이예경. (2012). 확증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1p~31p). DBpia
2) Paula Kaanders. (2022). Humans actively sample evidence to support prior beliefs. PMC.
3) Kelley Harold & Thibaut John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Oxford Academic.
4) 김향미, 이소영. (2016). 상호의존성과 갈등 관계의 재고찰. DBpia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276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276

dlckfgml19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