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은
강지은
[한국심리학신문=강지은 ]
예전의 자신을 떠올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무언가에 열정적이었고, 새로운 것에 쉽게 설렜으며, 거울 속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던 시절.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요즘은 예전보다 조용해졌고, 무기력하거나 이유 없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도 많아졌다. 예전 사진을 보며 “그때는 더 생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한다. 그때의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예전에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는데...” - 잊히는 자아의 시작
위와 같이 한때 내가 좋아했던 나를 잃은 것 같은 감각은 20대에게 꽤 흔하다. 중고등학생 때 느꼈던 생생한 자아 감각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나온 후 현실을 마주하면서 흐려진다. 졸업, 취업, 사회 진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감정은 무뎌지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 마치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의 어떤 핵심은 멀리 떨어져버린 듯한 기분. 그 감정의 이름은 ‘자기 상실감’이다.
왜 우리는 ‘예전의 나’를 그리워할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동일성(self-consistency)’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본다. 우리는 스스로를 일관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는 점점 간극이 벌어진다.
문제는, 그 간극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상화된 과거 자아(idealized past self)’로 기억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떠올리기보다는, 그때의 나에게서 가장 빛나던 순간만을 추려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포장된 그때의 나. 그렇게 과거는 현재보다 항상 조금 더 좋아 보이게 된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사이에서 자신을 비교하고, 자주 낙담하게 된다.
성장인가, 상실인가 – 전환기에서 오는 심리적 공허
이러한 자기 상실감은 특히 전환기에 자주 찾아온다. 대학 입학, 휴학, 졸업, 이직, 독립 등. 새로운 시작은 늘 기대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지만, 동시에 기존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던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한 아이’라는 식의 명확한 역할이 있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면 그 역할이 모호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정체성이 비워진 자리에는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만이 남는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런 상태를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라고 설명한다. 이는 한마디로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공백 상태’이다. 과거의 나는 멀어졌고, 새로운 나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 사이 어중간한 지점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진다.
‘무너진 자아상’을 다시 세우는 심리적 리셋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를 미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의 나 역시 고민이 많았고, 불안정했다. 다만 지금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했을 뿐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종종 현실을 회피하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과거에 머물기보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내가 나를 잃었다는 감각은, 사실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우리는 종종, 변하는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유기적이고 흐르는 존재다. 과거의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상실감은 때로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성되기 직전의 진동이다. 그 감정은 성장통이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여정의 일부다.
어느 날은 예전보다 어른스러워진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느 날은 다시 그때의 감성을 떠올리는 순간이 있다. 그 모든 시기의 나를 한 줄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나 또한 그 시절의 나만큼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Lecky, P. (1945). Self-Consistency: A Theory of Personality. Island Press.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450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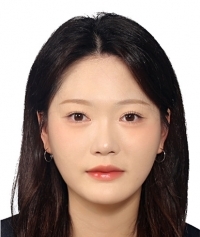
kje07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