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김동연
[한국심리학신문=김동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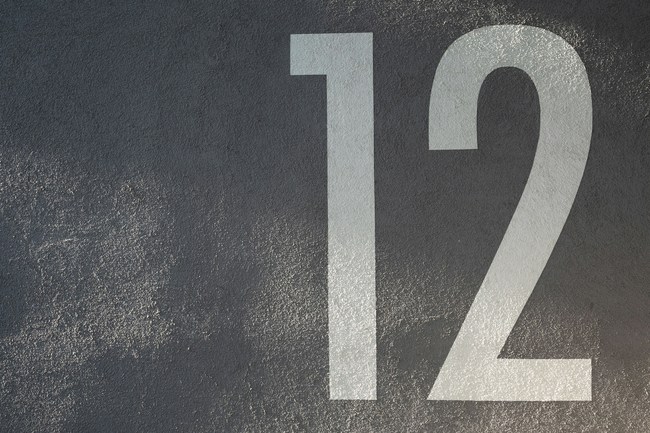
초등학교 1학년 반 번
초등학교 2학년 반 번
⋮
고등학교 3학년 반 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몸담았던 ‘학년-반-번호’를 모두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출중한 기억력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적어도 나는 당신 편이다. ‘학년-반’까지는 어떻게든 떠올렸지만, ‘번호’는 어렴풋하다. 일 년씩 내리 적어 온 열두 공식은 여느 수학 공식과 다름없이 휘발되었다.
얄팍한 생각
이러한 심리는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학창 시절에 나와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번호이다. 같은 해에 학년과 반이 같은 친구는 허다하나, 번호까지 같은 경우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만큼 번호가 기억되진 않는다. ‘나’보다 ‘우리’가 기억되는 것일까. 얄팍한 계산이지만, 학교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 앞선다고 도출할 수 있다. 그 시절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자신보다는 친구들과 얽힌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때가 좋든 싫든 그렇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대형과의 경우에는 분반이 있으나, 대부분 학과로 퉁 친다. 교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학번을 이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년간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졸업하더라도 번호의 주인은 한 사람이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뇌에 군번을 새길 수밖에 없다. 만약 전역했다면 번호를 되뇌어보길 바란다. 까먹으래야 까먹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시 얄팍한 계산법을 사용하자면, 나이를 먹으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치중하게 된다.
매차 ‘얄팍함’을 방패 삼아 논거 미약한 사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서양에 비해 동양이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한다는 통념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는 점차 옛말이 되어간다.
고리타분한 학교의 역할
최근 심심치 않게 고등학교 자퇴생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곤 한다.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하기는 어려우나,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저마다 모종의 사유가 있겠지만, 대다수가 ‘수능’이다.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은 일찍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수능에 매진하겠다는 목적이다. 성적 이외에도 다른 평가 항목에 구애받는 내신과 달리, 수능은 오로지 성적만으로 판가름하기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방안인 셈이다. 심지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 혀를 끌끌 찬다면, 당신은 졸업한 지 한참 지났거나 현재 고등학생과는 하등 관련 없는 사람일 것이다. 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사고는 현 시류에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입학하고자 할 때, 위법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 역시도 혀를 끌끌 찬다. 오직 입시만이 학교의 존재 이유라면, 학교의 목적은 시험이고 교육의 목표는 성적이란 말인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전부일 경우, 학교라는 집단은 더 이상 개인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나친 사교육, 높은 학구열,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 공부 이외의 평가 요소 등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됐다.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았다. 이 폐단은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를 거쳐 간 사람들의 불찰이다. 당시에는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막상 졸업하면 외면한다. 그렇게 교육받아 온 학생이 이끌어갈 사회는 기어코 답습되고, 사고는 두터워지기 마련이다.
본 글의 논지는 교육의 문제를 꼬집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일개 범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멀찍이서 판세를 바라보는 자의 소회 정도로 해두자. 어차피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나 개인주의 중 택일하여 돌아가지 않는다. 사회는 집단과 개인의 집합이고, 그 연결점에는 학교가 있다. 말인즉슨, 학교는 집단에서 개인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인 셈이다.
다시 묻는다. 12년 동안 몸담았던 ‘학년-반-번호’를 모두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추억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닐 테니까. 언젠가 열두 개의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올까 조금은 두렵다. 그저 이 물음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527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527

kdy0106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