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은
강지은
[한국심리학신문=강지은 ]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니가 처음이야.”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사다. 상대가 관심 없는 듯 굴고, 연락이 잘 안되고,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는 경우가 많다. 차갑고 무심한 상대에 대해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한 번의 따뜻한 행동에 마음이 확 넘어가 버린다. 왜일까. 잘해주는 사람보다 무심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뇌와 마음이 만들어내는 ‘심리 게임’이 숨어 있다.
무심함이 주는 ‘불확실성 효과’
심리학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매력을 더 크게 느끼는 현상을 ‘불확실성 효과(uncertainty effect)’라고 부른다.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때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나를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보다,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험자들이 더 관심을 보였다. 확신할 수 없는 상대의 태도는 뇌에 간헐적으로 보상을 주는데, 이 ‘간헐적 보상(intermittent reward)’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뇌가 흥분하고 상대에게 더 집착하게 만든다.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하고 속상하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오면 기쁨과 안도가 배가되고, 한 마디에 기분이 금방 풀린 경험이 있는가? 이처럼 무심함과 관심 사이를 오가는 간헐적 보상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상대에게 더 빠져들게 만든다.
뇌의 보상 회로와 설렘
연애 전 ‘썸’을 탈 때 심장이 더 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연락 하나에 기분이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변화를 큰 자극으로 인식한다.
하버드대 헬렌 피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보상과 중독을 담당하는 영역인 복측피개영역(Ventral Tegmental Area, VTA)이 활성화되며, 도파민이 다량 분비되어 기쁨과 보상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의 설렘은 상대의 태도가 불확실할수록 더 강해진다.
결국 우리는 상대가 무심할 때, 그것이 관심의 부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상대에게 쓰게 된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대에게서 아주 가끔 받는 작은 관심에 크게 반응하며 ‘이 사람만이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회피형 애착과 무심함에 끌리는 이유
이 무심함에 특히 더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회피형·불안형 애착(Attachment Styles)을 가진 사람들이다.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관심과 애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익숙한 긴장감을 떠올리며 끌림을 느낀다. 무심한 상대를 통해 “내가 노력해서 관심을 얻어야 한다”는 상황이 반복될 때, 애착의 상처가 충족되거나 치유될 것이라는 무의식적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무심함을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기회’로 오해하기 쉽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어냈을 때, ‘이 사람조차 나를 좋아해 준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문제는 무심한 상대에게 끌리는 것이 일시적인 설렘으로 끝나지 않고, 집착과 자기 비난으로 이어질 때다. 상대의 작은 관심에 울고 웃으며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면,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된다. 마음의 허기를 무심한 사람의 관심으로 채우려는 순간, 그 관계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든다.
‘왜 나는 나에게 무심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것이 단순한 설렘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상처 패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자. 건강한 관계는 ‘긴장감’이 아니라 ‘안정된 애착’에서 시작된다.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에게서 확인받으려 하기보다, 나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 속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니가 처음이야’라는 대사처럼, 무심한 상대에게 끌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과 심리 패턴,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 끌림 뒤에 숨은 심리 게임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당신의 설렘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참고문헌
1) 코메디닷컴, [Website], 2024, "난 왜 매번 나쁜 남자에 끌릴까"...알고보니 '이런 성향' 있다
2) Whitchurch, E. R., Wilson, T. D., & Gilbert, D. T. (2011)
3) Fisher, H. E., Aron, A., & Brown, L. L. (2006)
4)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561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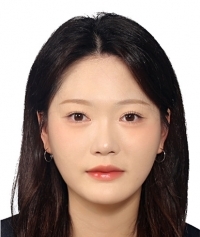
kje07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