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원
배정원
[한국심리학신문=배정원 ]
“분노는 뇌가 자동으로 작동시킨 감정일까, 아니면 몸과 환경을 해석해서 뇌가 만들어낸 느낌일까?”
 (출처=프리픽)
(출처=프리픽)
감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다.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경험과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인지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van Heijst et al.(2025)의 연구는 기본 감정 이론(BET)과 구성된 감정 이론(TCE)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며, 감정 과학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감정에 대해 “어떤 이론이 옳은가”가 아닌, “감정의 어떤 면을 다루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행동생물학자 틴버겐(Nikolaas Tinbergen)이 제안한 4가지 질문 — 기전, 발생, 기능, 진화를 기준으로, 두 이론의 역할을 비교해 설명했다.
감정은 주어진 것 vs 감정은 해석된 것
BET는 감정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슬픔, 분노, 두려움처럼 기본적인 감정은 얼굴 표정, 생리 반응, 신경 회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종을 넘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감정은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emotion’이라는 것이다.
반면 TCE는 감정이 몸 내부 상태와 외부 맥락을 바탕으로 뇌가 구성해내는 예측적 산물이라고 본다. 뇌는 상황에 맞게 감정 범주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느끼는 경험’, 즉 ‘feeling’을 만들어낸다.
van Heijst 연구진은 이 차이를 “BET는 감정의 진화적 기능을, TCE는 감정이 발생하는 신경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며, 두 이론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프리픽)
(출처=프리픽)
하나의 감정, 두 개의 설명 방식
이 연구는 틴버겐의 4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각각의 이론에 적용해 비교했다.
1. 진화(Phylogeny): BET는 감정이 수백만 년 동안 생존에 유리하게 작동해온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2. 기전(Mechanism): TCE는 감정이 뇌의 예측 처리 시스템과 interoception(내수용 감각)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3. 발달(Ontogeny): 감정은 성장, 학습, 문화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TCE의 핵심 영역이다.
4. 기능(Function): BET는 감정이 위협 회피, 사회적 신호 등 생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BET와 TCE는 서로 충돌한다기보다는, 감정이라는 현상을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프리픽)
(출처=프리픽)
통합이 아닌 균형, 감정 연구의 방향
논문은 두 이론이 감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무리한 통합 시도는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BET의 ‘감정 범주’와 TCE의 ‘구성된 느낌’을 같은 개념으로 다루면, 감정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흐려질 수 있다.
감정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감정을 어떤 틀로 이해하고 설명하느냐에 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감정이 하나의 고정된 반응 회로에서 비롯된다는 가정을 점점 더 의심하고 있다. 감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라기보다, 다양한 신경망과 맥락적 해석이 얽힌 복합적인 구성물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감정의 형성과 조절 과정을 다룬 실험들은 기본 감정 이론(BET)과 구성된 감정 이론(TCE) 모두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Default Mode Network(DMN)와 관련된 실험이다. 향정신성 물질인 psilocybin을 단회 투여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일시적으로 감정 반응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유연해지는 경험을 보고했다. 감정 범주화가 해체되는 듯한 이 변화는 뇌 내 주요 연결망이 재구성되는 신경학적 흔들림과 관련이 있으며, 감정이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뇌가 신체와 환경에 기반해 구성하는 예측의 산물이라는 TCE의 핵심 주장과 연결된다.
반대로, Paul Ekman의 미세 표정 이론은 여전히 강력한 생물학적 기반의 감정 설명으로 남아 있다. 감정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얼굴 표정과 생리 반응은 감정의 존재를 드러내는 공통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BET의 핵심 명제이기도 하며, 감정을 '구성된 결과'가 아니라 '고정된 생리 반응'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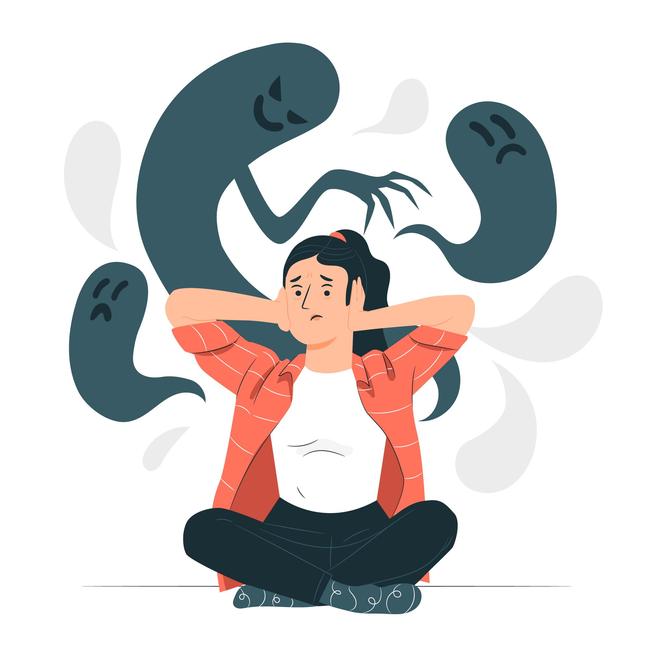 (출처=프리픽)
(출처=프리픽)
여기에 Jaak Panksepp의 연구가 더해지면, 감정은 뇌 깊숙한 원시 회로에서 유래한 기본적인 신경 감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SEEKING, RAGE, FEAR와 같은 감정 회로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생존과 직결된 반응 체계를 보여주며, 감정이 선택 가능한 인지적 산물이 아닌 본능적인 작용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뇌과학은 감정이 단순히 본능이거나 구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상황에 따라 양쪽 성격을 모두 지닐 수 있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 이론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틀을 조합하여 감정이라는 퍼즐을 해석하는 통합적 시선일지도 모른다.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감정은 신체적 반응일 수도 있고, 뇌가 구성한 주관적 해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을 너무 단일하게 정의해왔다는 점이다.
BET는 감정이 진화적 목적을 위한 구조적 반응이라고 말한다.
TCE는 감정이 몸과 환경을 예측하고 조절하기 위한 뇌의 구성물이라고 설명한다.
어쩌면 감정은 이 두 가지 설명이 모두 필요한 복합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Barrett, L. F. (2017).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An active inference account of interoception and categoriza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2(1), 1–23. https://doi.org/10.1093/scan/nsw154
2.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 Emotion, 6(3–4), 169–200. https://doi.org/10.1080/02699939208411068
3. van Heijst, K. F., Schalkwijk, F., & Zeelenberg, M. (2025). Basic emotions or constructed emotions: Insights from taking an evolutionary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https://doi.org/10.1177/17456916231218460
4. Carhart-Harris, R. L., Erritzoe, D., Williams, T., Stone, J. M., Reed, L. J., Colasanti, A., ... & Nutt, D. J. (2012). Neural correlates of the psychedelic state as determined by fMRI studies with psilocyb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6), 2138–2143. https://doi.org/10.1073/pnas.1119598109
5. Barrett, L. F., & Satpute, A. B. (2013). Large-scale brain networks in affective and social neuroscience: Towards an integrative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brain.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23(3), 361–372. https://doi.org/10.1016/j.conb.2012.12.012
6. Panksepp, J. (2011). Cross-species affective neuroscience decoding of the primal affective experiences of humans and related animals. PLoS ONE, 6(12), e2123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21236
7.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2024). Psilocybin for mental health and addiction: What you need to know.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s://www.nccih.nih.gov/health/psilocybin-for-mental-health-and-addiction-what-you-need-to-know
※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 심리학, 상담 관련 정보 찾을 때 유용한 사이트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심리학, 상담 정보 사이트도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 재미있는 심리학, 상담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The Psychology Times)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593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10593

lucybae.wo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