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연
이정연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정연 ]

#.1년 전,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전 국민이 들썩였다. 2008년,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유도하여 성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탈장,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12년이었다. 국민들은 조두순의 잔혹한 범죄에 한 번 분노했고, 12년이라는 형벌에 두 번 분노하였다.
12년이 지난 2020년,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며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자 국민 청원이 이루어지고, 여론이 분노로 들끓었지만 조두순은 결국 출소했다.
그 때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두순에게 더 큰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당시의 법률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 12년형 밖에 없었다.’
#. A씨는 딸아이가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딸의 가해자를 찾아가 타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학교에서 더 극심한 괴롭힘과 정서적 폭력을 가했고 A씨는 참다못해 딸의 아이들을 찾아가 머리를 쥐어박았다. 이 일로 A씨는 고소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 매스컴에 실리자 네티즌 댓글로 온통 분노를 표출했다
‘판사, 네 딸이 당해도 그렇게 놔둘거냐?’ ‘A씨 잘했다. 응원한다.’ ‘법이고 뭐고 나 같아도 눈 뒤집어지겠다.’
#. 몇 달 전, 강원 양구의 한 기숙사 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들의 따돌림에 견디다 못해 학교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벌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과, 출석정지 10일이 전부였다. 형사고소를 해도 정신적 폭력, 즉 ‘은따’라 증거가 없음으로 처벌이 미미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소견이 따랐다. 유가족은 가슴이 무너졌고,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댓글을 달았다.
‘괴롭혀서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출석정지?’ ‘사실상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인데, 직접 찌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냐’ ‘이게 법이냐’
법은 ‘준칙’이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광화학 당략의 ‘법칙’같이 불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준칙’인 법은 다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법칙과 혼동할 수 있지만 법이 나라마다 다른 것처럼, 법은 문화나 환경, 또는 특정 민족에게서 비롯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는게 ‘법’이다. 그래서 법은 문화 속에 속해있는 것이다.
가장 좋은 ‘법’은 법의식과 법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인적 차원이 있다. 람페에 따르면 ‘법의식이 인간이, 개인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회 전체에는 법체계로서 사회적 행위에 최고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 속에서 연대의 한 부분을 형성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과 법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지나치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없어져 그 법은 죽은 법이 되고 만다. (변학수, 조홍철(2007),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 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한국독어독문학회, 경북대학교)
앞에서 설명한 사례들이 바로 ‘죽은 법’의 사례다. 국민의 법정서나 법감정을 담아내지 못한 판례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은 법문화나 법감정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융통성 없고 딱딱하며 틀에 갇힌 법들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법=발달 심리학이라고?
발달 심리학은 인간의 한 생애를 초점으로 두어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이다. 발달 심리학에서 유아기를 보면, 우리는 ‘법’이 ‘발달 심리학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한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로부터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으로부터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훈육 받는 것은 곧 규범이자 준칙이 된다.
특히 ‘행동심리학자들은 동물들이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체계에서 인간 또한 그 환경을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집단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맞추어져 있고, 그들은 그것이 장애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장애를 유발한다고 본다‘ (변학수, 조홍철(2007),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 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한국독어독문학회, 경북대학교) 즉, 성장하면서 부모의 도덕적 규범이나 안전과 같은 ‘감정’을 체득하여야만, 사회에서 규정한 ‘법이라는 준칙’에서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이란, 결국 인간의 감정과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좋은 법을 위해서’
필자는 무조건적으로 ‘감정’에 의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이 ‘준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있으며 도구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융통성 있고, 말랑한 법을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이 적절이 섞일 필요가 있다. 도구적인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을 위해서 법이 ‘준칙’임을,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상을 충분히 담아 우리나라가 ‘법’의 선진국이 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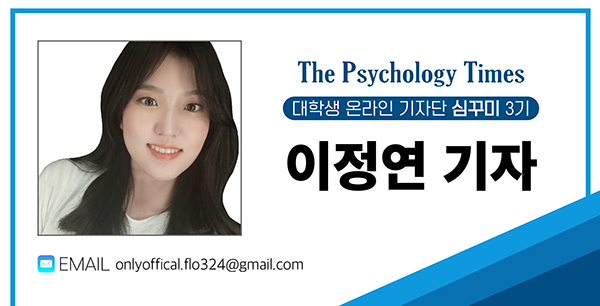
참고 문헌
1.위의 사례들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2. 전해정,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2013), 국민대학교
3. 변학수, 조홍철(2007), 법의식, 법감정 그리고 법제도- 독일과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내재된 법의식의 문화학적 고찰, 한국독어독문학회, 경북대학교
4. 변종필,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한국법철학회
5. 법, 이성과 감정: 제27회 세계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학술대회 참가 보고, 오병선, 한국법철학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2390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2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