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서
서민서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서민서 ]

안녕하세요. 심꾸미 3기로 활동한 서민서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호칭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그만큼 이 활동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후다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심꾸미 공고를 보자마자 “이 활동은 꼭 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심리학이라는 주제도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정성스레 적었고 조마조마 합격 발표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리학을 주제로 글을 쓰는 일을 기계공학과 학생에게 맡긴다? 저라도 안 맡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네요. 제 가능성(?)을 봐주신 편집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합격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글을 쓸지 명확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심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짧게 내 생각을 덧붙이는 무난한 글을 쓸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OT 때 대표님이 “용기 있는 글을 쓰라”고 하신 조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전공자도 아닌 저에게 글을 쓸 기회를 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고, 심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고르는 주제들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쓴 첫 번째 글이 ‘토끼와 거북이의 심리학’입니다. 저는 어릴 적 주위로부터 “너는 지나치게 미련하게 산다. 좀 융통성 있고 영리하게 살아라”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은 착실하게 해냈지만, 주위 사람과 소통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저만의 고집대로 돌아가기도 했고, 이 때문에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북이 같은 사람이었고, 토끼처럼 사는 법은 몰랐습니다. 커가며 큰 노력을 통해 이런 제 단점을 보완했지만, 제 삶의 경험을 온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상태였으며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이 물음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심리학’이 탄생했습니다. 여러 고전문학에서 토끼는 영리함을 상징하고 거북이는 집중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영리하게 사는 법과 헌신적으로 사는 법 둘 다를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해리포터>와 말에 담긴 마법’입니다. 옛날이야기의 심리학을 다룬 첫 번째 글이 좋은 반응을 얻자, 용기를 얻어 현대에 들어 가장 큰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이야기인 <해리포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해리포터>의 열렬한 독자이자 어떤 형태로든 마법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즐기며 쓴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마법’이라는 모호하고 신비로운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 '마법'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마법의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글은 ‘자기 긍정? 자존감을 위한 자기부정’입니다. 이 글의 소재는 사실 조던 피터슨 심리학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에서 얻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들어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데 그 생각만큼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머물고 싶은가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 말이 저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자존감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억지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난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마지막 글은 ‘한국의 신화: 원천강본풀이’입니다. 저의 독창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제시된 글이기도 하고, 그만큼 엄밀한 검증이 결여된 글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한 신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신화의 교훈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신화란 심리학 지식과 지혜가 가득 들어 있는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는 태초부터 인간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번쯤은 분석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지식이 더 쌓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다시 한번 한국의 신화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렇게 총 4편의 글을 3달 동안 작성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업로드하면서 즐거웠고, 글을 쓰고 다듬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심꾸미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 심리학 공부와 글쓰기는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The Psychology Times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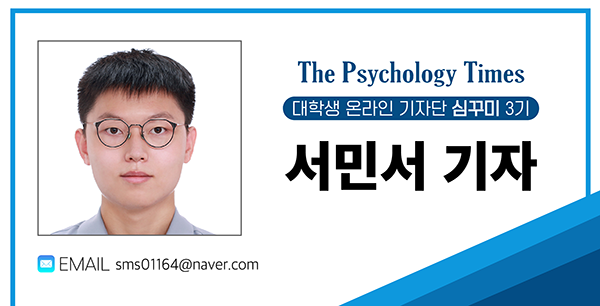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2443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2443

sms011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