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한석
변한석
[The Psychology Times=변한석 ]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습득하고 발음 하나를 내는 것 조차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한 엄청난 일이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숨 쉬듯이 쓰는 이 언어는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우리 인류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습득을 하는지, 여러 이론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논란이 있다.
오늘은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 언어의 습득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유아가 옹알이를 하는 건 언어의 전 단계로, 역시 의사소통의 목적도 포함하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인간은 옹알이를 할 수도 없는 태아 상태에서도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
DeCasper와 Spenecer의 1986년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들에게 6주간 특정 책을 큰소리로 읽게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들에게 또 엄마가 읽어줬던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했다. 친숙한 이야기를 들을 때와 낯선 이야기를 들을 때 특수한 젖꼭지를 사용해서 빠는 속도를 측정했는데, 오직 친숙한 이야기를 들을 때만 빨기 속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는 낯선 사람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선호한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 출생 전부터 말소리를 지각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뜻한다. 엄마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소리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생득설은 언어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배움이 가능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의한 사건으로 언어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언어를 습득하고자 한다.
Godlin-Meadow와 동료들은 생득적 기제를 증명하기 위해 선천성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실험 대상자는 1살에서 4살 사이의, 수화를 배워본 적이 없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 스스로 ‘몸짓 언어’를 개발해 내었는데, 이들의 언어는 청각을 가진 아이들의 언어와 많은 점에서 유사했다. 아동들이 개발한 ‘가정수화(homesign)’는 정상 청각을 가진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나 습득 방법과 거의 비슷하게 발전됐다고 한다. 하나의 손짓으로 말하기가 약 생후 18개월 때 나타나고, 이어서 두 개의 손짓으로 말하기와 3개의 손짓으로 말하기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상 아이들이 두 단어와 세 단어 산출 단계 때와 유사한 의미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정적 시기 가설이란 언어를 배우기 적당한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가 지나면 언어습득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가설이다.
결정적 시기 가설을 대표하는 두 개의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야생 인간’ Victor인데, 이 남자아이는 1797년 프랑스의 한 숲에서 12세에서 13세로 추정되는 나이로 발견됐다. 이 아이는 발견 당시 청력은 정상이었지만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의사들은 그가 사회화와 언어를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Itard라는 의사는 포기하지 않고 5년간 Victor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하지만 Victor의 언어습득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Victor가 결정적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격리당한 Genie의 이야기다. Genie Wiley는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빛 하나도 들지 못하는 방 안에서 감금당한 채 13년을 지냈다. 하지만 극적인 행운으로 Genie는 집을 탈출하게 됐고, 보호시설에서 언어를 비롯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Genie는 배움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Genie 역시 언어발달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결정적 시기 가설이 주목받는 건 많은 학부모가 ‘조기교육’, ‘조기유학’에 목을 매는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학 전 연령대에 유학을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실제로 잘 배울 수 있으며, 부모님은 아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은 모두 납득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언어의 습득 방법과 시기를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습득된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기사
참고 자료
하길종(2001). 언어 습득과 발달. 국학자료원
decasper & spence. Prenatal maternal speech influences newborns' perception of speech sounds (1986)
Susan Goldin-Meadow & Heidi M Feldman. Development of language-like communication without a language model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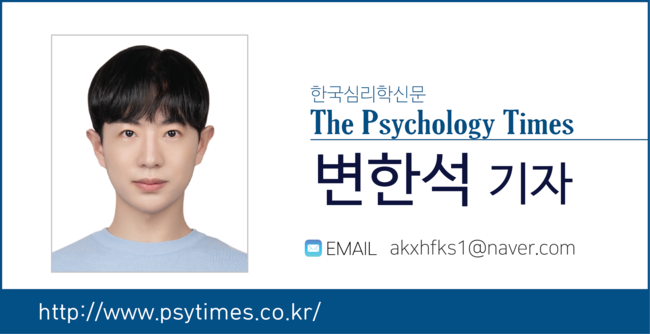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3725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3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