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혜
김동혜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장애는 출소 이후 사회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처벌은 일반 범죄자의 처벌과 달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감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없이 오직 형의 집행만이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사회복귀 이후 재범률은 높아지고 정신장애가 악화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치료감호
정신장애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내용이다.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감호의 목적은 단순한 범죄자의 수용이나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촉진에 있다.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형벌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치료감호는 정신장애의 치료와 개선에 초점을 둔다.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치료 처우는 피치료자의 증상에 따라 상이하다. 1호 처분자인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환경치료, 심리극·음악치료 등 특수치료가 이루어지며, 2호 처분자인 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단약/단주 프로그램과 재활치료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진다. 한편 3호 처분자인 정신성적장애자에게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치료감호시설은 사회기술적응훈련, 정신사회재활교육, 가족교육, 퇴소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정신장애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한다.
치료감호의 현실은?

효과적인 치료감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길이다. 뿐만아니라 정신장애 범죄자의 원만한 사회 적응은 재범률과 직결되므로 사회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도 치료감호제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치료감호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정책의 엄벌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치료감호소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무려 104명에 달하며,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가 20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료감호소에서는 제대로 된 회진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치료는 기계적인 약 처방에 그치고 있다. 치료감호소의 과밀화와 불안정한 운영은 최근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와 인용수가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행해지는 보호관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관리 인원은 106명으로, OECD 평균인 27.3명의 4배가 넘어간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 달에 4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의 면담이 있어야만 재범 방지 효과가 있지만, 보호관찰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달에 1, 2회, 회당 5분 남짓의 면담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실한 사후 관리는 정신장애인의 사회 부적응과 재범률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강력 범죄 위험성은 치료를 통해 9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치료감호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치료감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을 추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안전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 역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기사
공황발작 응급처치: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법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 Milgram의 복종 실험과 Asch의 동조 실험으로 본 ‘악의 평범성’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회불안장애와 자기초점적 주의 및 사후반추 사고의 관계
참고문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장승일. (2016).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이론실무연구, 4(2), 103-128.
임현경. (2022). 뒷전으로 밀리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939.
전혼잎·최나실·최은서. (2022).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612060002593?did=NA
최나실. (2022). 치료감호소 의사 "하루 환자 200명까지... 약도 기억 안 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619030005603?di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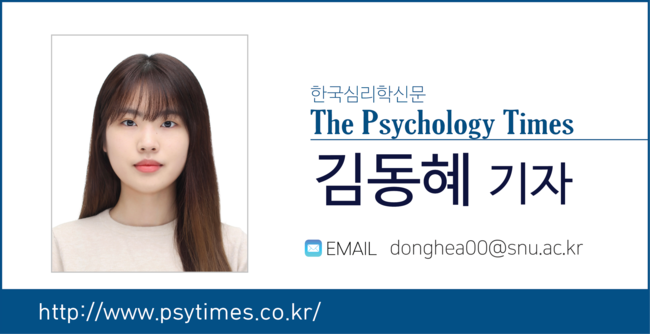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348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