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서
서민서
[The Psychology Times=서민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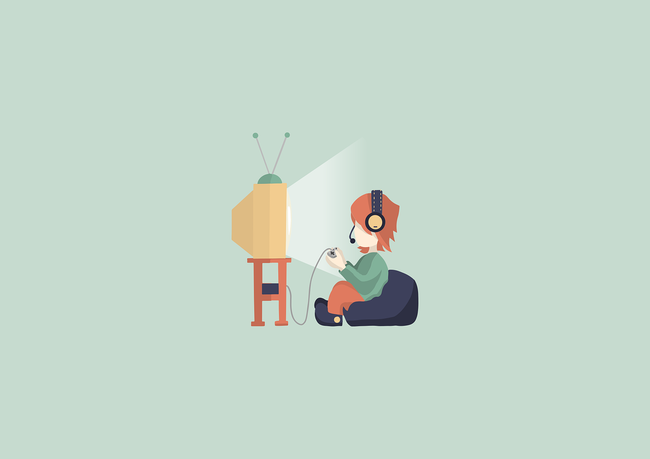
욕을 쓰는 이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욕을 해봤을 것이다. 친구와 싸울 때 욕을 하기도 하고, 발가락을 문지방에 찢었을 때 하기도 한다. 욕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욕을 사용한다.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형성된 분위기나 문화가 욕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욕을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을 쓴다.
예를 들어 한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을 구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욕을 좀 한다고 "저거 저거 못 배워 먹은 놈이구먼"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주인공이 가진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며 영화에 몰입할 가능성이 크다. 주인공이 욕을 했다는 사실보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이나 주방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높은 집중력과 몸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욕을 많이 사용한다. 욕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고통을 덜 느껴서 힘든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쓰는 편이 이상적일지는 몰라도, 조금만 딴생각해도 화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잘리는 상황이라면 달리 선택지가 있겠는가?
이처럼 거칠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도 같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마냥 나쁘게 볼 수만 없다. 거친 표현이나 욕설은 상대방과 자신의 독립심, 강인함, 책임감 같은 남성성을 시험하고 채찍질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임을 하면서도 욕을 해야 할까?
하지만 욕을 안 쓰는 게 더 좋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반복적으로 욕을 사용하면 어휘력이 약해지고, 충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어릴 적 욕설을 일찍 접할 경우, 영구적으로 뇌에 손상이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언어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진다고 누가 죽거나 다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즐겁기 위해 하는 게임에서 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 이길 때/ 질 때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온라인 게임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이 성취, 세련, 공감 3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게임 이길 때/ 질 때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온라인 게임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게임이 성취, 세련, 공감 3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높은 점수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성취 경험으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성취) 자신의 캐릭터나 가상의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미적 감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세련) 누군가는 게임 내에서 타인과 친교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한다. (공감)
문제는 게임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많이 의존할 경우 생겨난다. 게임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게임 결과나 게임 속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게임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게임에 과몰입하는 사람은 게임 속 자신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하면 감정적으로 힘들어한다. 욕을 써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영화 속 영웅이나 일상 속 영웅들과 다른 점은 훨씬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게임 속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점이다.
게임 속 정체성의 대안
 어떤 목표가 더 나은 목표일까?
어떤 목표가 더 나은 목표일까?
게임 몇 판 진다고 부서질 정체성이라면 애초에 그런 정체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게임에서 이기는 일보다 다른 참가자들이 같이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욕을 쓰는 습관이 있다면 욕을 조금씩 줄여보는 '나만의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결심이 섰다면,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게임을 해보자.
'이번 판에는 채팅창에 욕을 쓰지 않겠어.' 혹은 '이번 판은 혼잣말처럼 하는 욕도 5번 이하로 해보자' 와 같이 자신에게 어려워 보이는 기준을 정하자. 만약 기준을 지키는 데 성공했으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도 줘보자. 그러면 혹여나 온라인 게임은 지더라도 '나만의 게임'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면, 더 중요한 게임에 참가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 주위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당신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승리가 아닐까?
지난 기사
[참고문헌]
-유혜린 and 유승호. (2021). 온라인 게임의 자아정체성 기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드의 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2, 162-187.
-조던 피터슨.(2018).12가지 인생의 법칙.서울:메이븐
-Stephens R and Robertson O (2020) Swearing as a Response to Pain: Assessing Hypoalgesic Effects of Novel “Swear” Words. Front. Psychol. 11:723
-지식채널 e [욕의 반격].(2013).URL: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539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539

sms011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