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연
정수연
[The Psychology Times=정수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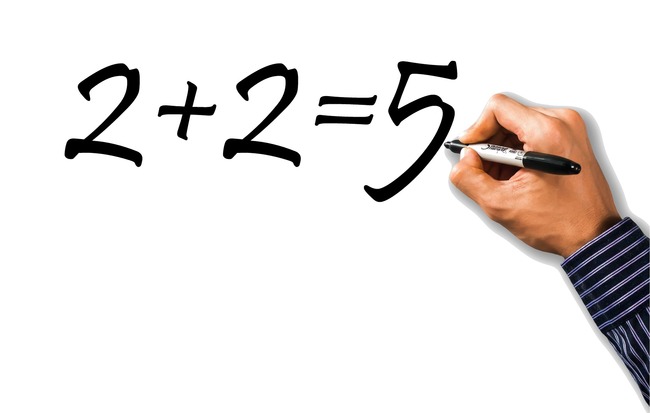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삐익!”하고 교실에 울려 퍼지는 삑사리에 당황한 손이 덜덜 떨립니다. 학창 시절 리코더 수행평가를 보던 저의 모습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없던 저는 음악 수행평가만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점수도 점수지만, 친구들 앞에서 삑사리는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연습을 잘했어도 선생님 앞에만 서면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분명 연습이 부족했던 건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문제를 찾아내려면 제가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연습할 때와 시험을 볼 때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날 바라보는 친구와 선생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저의 리코더 연주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존재로 인해 어떤 일을 잘 수행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Triplett(1898)은 아이들이 혼자 낚시줄을 감는 것보다 다른 아이와 함께 감을 때 더 많은 낚시줄을 감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Triplett의 연구는 많은 후속 연구를 이끌어내며 ‘사회적 촉진 이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촉진이론’이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특정 행동이 더 강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사회적 촉진이론은 우리에게 익숙한 ‘카공이 더 잘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중효과(audience effec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카페에선 공부가 잘되는데, 저는 왜 리코더 수행평가를 망친 것일까요? 똑같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말이죠.
성과를 결정하는 ‘우세한 반응’
Zajonc(1965)의 연구가 이 의문점을 해결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바로 좋은 성과나, 나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일을 수행할 때 성과의 양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흥분한 정도를 ‘추동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높아진 추동 수준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촉진 이론 중에서도 추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추동 이론에서는 추동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세한 반응(dominant response)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으로 인해 흥분할수록 자신이 가장 하기 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낚싯줄을 감는 일은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지만 저에게 리코더를 부는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즉, 아이는 낚싯줄을 잘 감는 것이 가장하기 쉬운 ‘우세한 반응’이었다면, 제가 리코더를 부는 상황에서는 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세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추동 이론에서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 사회적 촉진 현상이 더 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도, 더 못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은 노력뿐!
사회적 촉진 이론은 오랜 시간 연구되며 다양한 이론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와 평가에 대한 기대가 수행을 촉진하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수행이 촉진된다는 후속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부적인 이유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타인의 존재가 나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나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과제에서는 더 좋은 성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Zajonc의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입니다. 더 많이 연습하고 반복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단순하고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세한 반응이 실수에서 멋진 수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노력에도 타인 앞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정말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과정 동안 나의 우세한 반응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난 기사
참고자료
Zajonc, R. B. (1965). Social facilitation. Science, 149(3681), 269-274.
한백희.(1987).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사회과학연구,3(),87-102.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695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695

tndus41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