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환
정승환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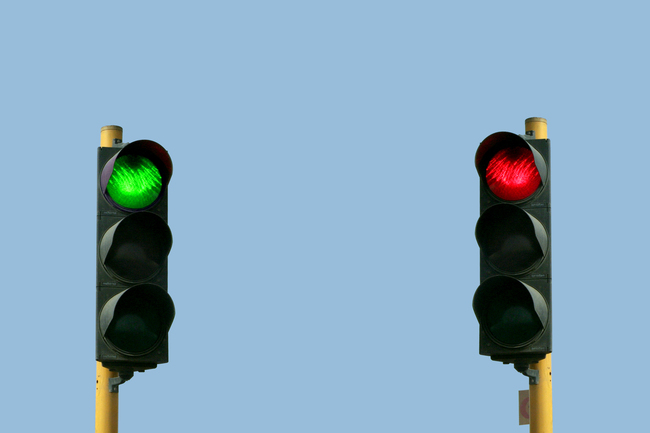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가 즐겨 찾는 초록 창에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면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도 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를 읽어보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부분 짤막하게 조현병을 치료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조현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조현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없이 단순히 정신질환과 범죄가 연관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조현병에 관한 오해와 정신장애
하지만 조현병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2016년 기준 인구대비 범죄율 0.1%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범죄율 1.4%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조현병이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 말에 따르면 조현병 약을 먹은 이후 70~80%의 환자들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와 함께라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조현병이 포함되는 정신장애는 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신장애의 국제적 표준인 DSM-5에 따르면 우울증, 불안 장애 같은 경우도 정신장애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 사람만 약 80만 명이 될 정도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질병이 되었다. 방송에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할 정도로 치료 받으면 나아질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현병도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처럼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현 위치
이러한 정신질환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편견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국가가 제정한 정신보건법은 현재까지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적 관점만을 고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야 정신건강을 인식과 예방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 법이 제정되기 이전 법률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정신질환에 대해 사회로부터 격리만 초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과 치료적인 모델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이었고 사회 통합과 회복을 위한 복지 차원의 법률은 2016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을 사회 인식 개선과 복지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시작한 것은 6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차원의 정신건강
반면 국제적 차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치료적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회복의 주체 차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지 오래다. WHO에서 1954년 치료모델을 도입한 이후로 재활모델(1980), 사회모델(2001)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최근의 관점은 UN에서 인권모델(2006)의 기준을 세움으로서 정신건강을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신장애로 여기고 사회 안전망, 재활을 통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예산 투자나 인식에서 많이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법률 제정과 인식 개선의 노력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인식 변화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길
정신건강 인식 변화를 위한 방향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현재 국가 정신건강 정책은 의학적 관점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질환을 치료적 관점에서 머무르게 하고 예방적 차원이나 사회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한계에서 나아가려면 정신질환 법 제정에 사회복지사나 상담심리사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서 치료적 관점과 동시에 사회 복지적 관점, 인권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보편화 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 지출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예상 중 정신건강복지예산은 2.7%로 WHO에서 권하는 5%에는 턱 없이 모자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예산 배분뿐만 아니라 예방적이고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 배분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신질환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지난 기사
나 우울증일까? (feat MMPI)
심리상담 법제화 필요성과 타 국가 심리상담법 소개
참고문헌
오성택, 조현병 40대, 흉기 들고 파출소 난입… 테이저건으로 제압, 2022.10.05.,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05503450?OutUrl=naver
강상경.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2022.
최준호, 정신장애인 범죄율 0.1%... 조현병 탓 몰아가기는 그만, 한국일보, 2019.06.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182321777751
이진한, 조현병, 관리하면 큰 문제 없어… ‘범죄자 취급’ 시선이 더 위험, 동아일보, 2021.10.2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0/109811205/1
나경세, 우울증 환자 3명 중 1명, 치료 어려움 겪어, 데일리메디, 2022.04.1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2865
전혼잎 외 2명,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한국일보, 2022.06.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612060002593?did=NA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788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788

jeongpsy25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