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금
김남금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

"남성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간을 찢어내고 허파를 잡아채려는 독수리와 매를 가슴속에 담아두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가능했지요. 소유에 대한 충동과 획득에 대한 격정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끝없이 탐내고 그들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바치도록 몰아갔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했던 말이다. 시대가 변했다고 남성의 자리에 여성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을까.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버지니아 울프의 말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프닝에서 수녀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여학생들이 있다. 수녀가 조회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라고 말한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학생들이 쫘악 옆으로 서는데, 무리에서 끼지 못한 단 한 사람, 에밀리 디킨슨이 남는다. 그리고 말한다.
죄를 지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죠?
에밀리 디킨슨은 버지니아 울프보다 앞선 세대이다. 신과 아버지의 법이 가정과 개인을 지배하던 시대이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에밀리가 말하자 감정도 의무라고 수녀가 말한다. 개인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에밀리 디킨슨이 시를 쓰는 것 역시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다. 밤에 불을 켜고 글을 써도 되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자와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시대에 에밀리 디킨슨은 반란을 일으키는 선언을 한다.
제 영혼은 제 거예요.
그녀는 신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의 법에 이따금 맞선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접시가 더럽다고 지적하자 접시를 받아서 깨뜨린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안 더럽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말한다. 여자들도 노예인데 남북전쟁이 자신과 왜 상관없는지 반문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종교의 억압과 강요는 일상이었다. 자신의 직관과 마음의 소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에밀리는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모두가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녀만 분리되는 기분이 달가울 리 없다.
그녀는 시를 ‘내세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내세의 구원을 신이 아니라 시에서 찾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법’ 체계에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는 신성모독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를 써도 여자라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발표해야 하는 시대. 각국의 명작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는 사회에서 에밀리의 고립과 고독은 필연이다. 그녀의 고독과 고립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성 예술가들이 겪는 문제였다.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 문화에서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에밀리 디킨슨은 괴로워했다.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결혼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 문화에서 비혼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였다. 샬럿 브론테가 <제인 에어>와 <빌레뜨>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묘사하다가 마지막에 결혼에 흔들리는 모습을 그린다. 공고하게 고착된 결혼 제도권 문화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독립적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남자와 동등할 수 없다면 사랑을 하지 않겠어.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말하는 에밀리는 구혼자가 달아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식의 따돌림 문화에서 에밀리에게 유일한 위안은 시를 쓰는 것이었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서 시를 쓸 작은 수첩을 만든다. 종이를 잘라서 바늘로 한땀 한땀 엮은 수첩에 그녀는 고독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언젠가 그녀가 믿는 신인 시를 세상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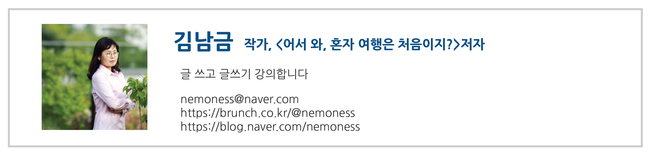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853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4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