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다연
양다연
[The Psychology Times=양다연 ]
 출처: pixabay(https://pixabay.com/photos/sculpture-prayer-hands-religion-3611519/)
출처: pixabay(https://pixabay.com/photos/sculpture-prayer-hands-religion-3611519/)
작년에 학교에서 들은 철학 강의의 주제 중 하나는 ‘신’이었다. 우리 수업에서 ‘신’은 좁은 의미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했다. 중세를 암흑기로 보낸 철학과 황금기로 보낸 기독교의 만남은 무교인 나에게 아슬아슬 줄타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단원이 끝나갈 때쯤 교수님께서는 철학의 관점에서 신은 ‘있는’ 존재가 아닌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다. 신은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종교는 없지만 신은 ‘있어야 한다’고 믿어서 신은 ‘있다’고 믿는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3년의 첫 날을 교회에서 맞이한 이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무교지만 외가 식구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가족을 따라 송구영신 예배에 다녀왔다. 출발하기 전부터 할머니께서는 새벽 세 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는데 괜찮겠냐며 겁을 주셨고, 나도 예배가 처음이라 ‘목사님 말씀을 듣다 졸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입구는 양복과 한복을 갖춰 입은 (아마도) 높으신 분들, 포대기에 싸인 아기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어르신, 예쁘고 멋지게 갖춰 입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만큼 신나는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감사 인사가 적힌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고 있었다. 자정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시작된 예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변 사람들과 포옹을 하며 감사 인사를 나누는 시간, (마시고 헛구역질을 할 뻔했던) 포도주와 (전혀 떡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이름이 떡인) 떡을 먹는 시간으로 금새 지나갔다.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정신은 없었지만 신기한 것 투성이인 시간들이었다.
예배가 처음이고 하필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빨라서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한 박자 느렸다. 모두가 일어서면 따라 서고, 옆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면 슬쩍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왔는지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고개를 숙이고 깍지를 낀 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순간 사람들의 기도가 차 아래 숨어있다 도망가버린 고양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게 속삭이는 기도 소리와 고양이가 도망갈 때 났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알 필요도,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방금 어떤 소리가 났고 이제 그것은 더이상 그곳에 없다는 점,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딘가로 갔으며 그것은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지 않았고, 증발하지도, 녹아버리지도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리고 갈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길고양이와는 다르게 이 많은 기도의 목적지는 단 한 곳이라는 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신을 본 적 없지만 기도까지 신에게 가지 말란 법은 없다. 기도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과거에 메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희망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생각했다.
교회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곳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것이다. 뭐 그리 감사한 게 많은지 모든 것을 고마워하는 이 사람들이 얄미워질 정도였다. 나는 지금 이곳에 와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나는 부처님도 믿는데, 그런 나에게도 고마운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다. 가슴 속에는 메마름과 방황이 없고, 설령 메마르고 방황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삶을 포기할 용기보다 고난을 이겨낼 용기가 더 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다른 교회, 성당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런 점에서 ‘있어야 한다’가 아닌 ‘있다’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기 직전에 성경의 구절이 랜덤으로 적힌 카드를 뽑았다. 내가 뽑은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다섯 번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결국 사촌 언니의 도움을 빌려 겨우 이해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으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냐는 뜻이었다. 언니는 “너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뜻이야”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은 있어야 하는 거구나’하고 깨달았다. 모든 걸 다 줄 거라고 믿었던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도 안 될 만큼 끔찍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리고 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나의 믿음도 변하지 않았다. 철학의 입장에서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은 ‘나쁜 철학’이다. ‘있다’와 ‘없다’는 ‘있다는 사실’과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모두가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도 세상의 모든 일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차피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니, 그냥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동시에 하는 막무가내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내 믿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옮겨갈지는 모르나 일단은 신은 있어야 해서 있다고 믿는 인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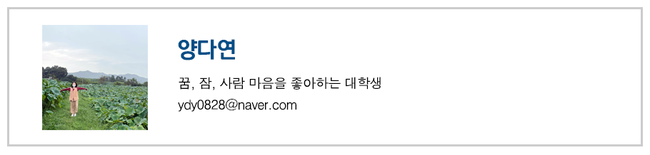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616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