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치
신치
[The Psychology Times=신치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름.
자식, 내 새끼...
대부분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고 또 지극하다. 어린 시절부터 첫째인 내게 보여준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아낌없이 퍼붓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한참 부족하다.

가족이란 테두리를 떠나 만나게 되는 관계의 대부분은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것이 확실할 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가족 내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의 부모에 대한 마음은 순수하고 해맑게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느 순간이 되면 사회에서 익혀온 그런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이란 그저 내리사랑 '다 필요 없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 다오' 이런 마음일 게다.
대학교 3학년 때였다. 학생회실 창가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언젠가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해 뒀는데 나와 맞는 환자가 있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다. 순간 멈칫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로 헌혈차가 왔는데 헌혈을 하러 갔다가 빈혈이 있어 헌혈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기억이 났다.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면 피를 뽑아야 하는 건가? 헌혈도 한번 안 해본 내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니. 티브이 다큐멘터리에서 암환자들에게서 골수를 채취하는 모습이 연상되고 이래저래 무서운 마음이 들어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어찌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기 전 엄마에게 물었다.
❝
엄마, 나랑 조혈모세포가 맞는 환자가 있어서 기증을 해 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는 1초의 망설이도 없이 내게 말했다.
❝
안돼, 하지 마.
전화를 끊기 전까지 세 번이나 더 강조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전화를 끊었다.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간혹 그때의 순간이 떠오른다. 결국 나는 다시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묻기 위해 걸려온 전화에 죄송하다고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찝찝한 마음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때 만약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환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치료의 희망이 나타나 잠시나마 기뻐했을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인생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촉촉해지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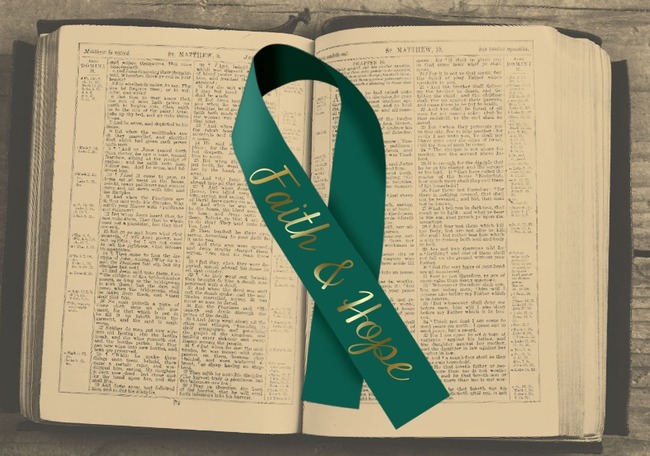
하지만 그때 사실 내게는 '하지말라'고 말려줄 엄마가 필요했던 것 같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야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나를 '강력하게 말려줄 누군가'가 절실했고,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그리고 마침 그런 고민을 하는 그 때 전화를 걸어준 것이다.
2013년 제주도에 가서 3개월을 살면서 매일 글을 쓰러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막 돌이 지나 보이는 귀여운 아기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찾아왔다.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페 아가는 사장님이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 주는 두 개의 과자 중에 하나를 내게 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와 엄마는 엄청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ㅇㅇㅇ는 혼자 커도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엄마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내게 그러지 말라고 눈치를 줬다. 대체로 '양보하지 말고, 네 것부터 챙기고, 실속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 왔던 것 같다. 미성년자일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맞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기 보다 왠지 모르게 무척이나 팍팍하고 피곤했다. 마치 마른입에 바게트 빵을 우걱우걱 씹는 것처럼 말이다.

자식, 게다가 첫째인 내게 많은 것을 쏟아부었고 또 기대했던 우리 엄마. 엄마는 내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아름다운 사람들만 살고 있지 않음을 알고 최소한 뒤통수 맞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아주 순수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키웠을 것이다. 그런 엄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제는 내 삶에서 '나'라는 것에 갇혀 앞도 뒤도 양 옆도 보지 못하는 아주 협소하고 메마른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628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