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영
최서영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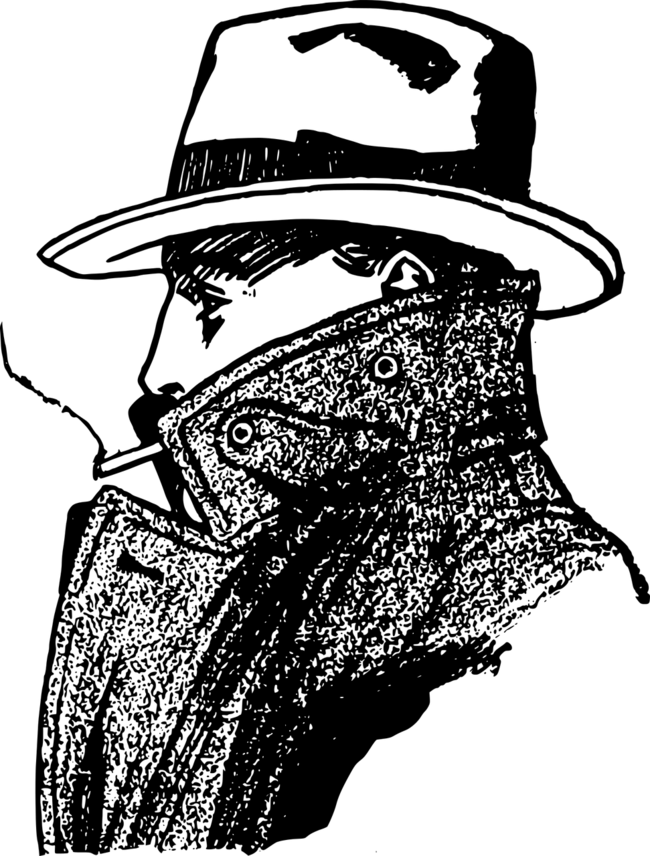
희대의 사이코패스 유영철부터 디지털 범죄의 사회적 경종을 울린 ‘N번방 사건’까지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치밀해지고 악랄해져서일까. 대중들은 미제 사건을 단번에 해결하는 척척박사처럼 묘사되는 프로파일러 혹은 범죄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범죄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를 보며 비슷한 뜻 다른 단어들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셜록 홈스를 보며 꿈을 키워온 이들은 자신이 범죄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프로파일러와 범죄심리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직업군의 차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범죄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저서 『최신 범죄심리학』에 따르면, 범죄심리학은 범죄나 특정 범죄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 행동을 분석하며 심리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좁은 의미의 범죄심리학은 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이며, 넓은 의미의 범죄심리학은 범죄 원인론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 예측 등의 형사 사법 체계 속에서 범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의 영역이다.
과거 범죄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범죄 원인론에 치중되었다. 범죄의 원인을 거시적인 사회현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개인들의 특정한 요인을 분석하는 개인 내적 범죄 원인론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범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주로 범죄 행동에 대한 심리적 원인, 범행동기 등을 밝히는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살인 · 강간 · 성범죄 · 아동학대 등 의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심리학적 연구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범죄심리학이란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는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로 범죄자의 행동, 교정, 예방을 연구하는 학문 이다. 이때, 심리학적, 생물학적, 심리-사회학적 이론 등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범행이 어디에서 귀인하였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범죄심리학자이다.
프로파일러란 범죄분석 심리관으로, 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해 용의자의 특성과 행동 패턴, 성별, 나이 등을 추론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지목된 용의자의 예상 경로를 파악하고, 검거 후에는 심리적 전략을 활용해 범죄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프로파일러는 사기, 횡령과 같은 단순범죄보다 범죄 사건의 특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연쇄살인 등에서 빛을 발한다.
프로파일러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범죄심리학자의 역할과 공통 분모를 가진다. 그러나 두 직업군은 수사 단계에서 만큼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의 나침반으로서 수사 방향을 설정해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범죄심리학자의 경우 검거 이후 기소 과정에서의 전문 수사 자문위원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일이 범죄심리학자의 역할이다. 즉, 범죄심리학자는 형사 사법 체계 속에서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필요할 때 이를 자문하는 역할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심리학자와 프로파일러의 역할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범죄심리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세상을 도모하기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제2의 셜록 홈스를 꿈꾸었던 학생으로 우리나라의 범죄심리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가 앞으로 범죄심리학을 주제로 글을 기고하고자 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심리학 관련 책인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를 읽으며 ‘범죄자는 나쁜 사람이기에 앞서 아픈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짙은 여운을 주었다. 기존에 범죄자는 그들만의 혈통을 가진 악마 같은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런 이유로 태생부터 내재하여 있는 악한 속성은 절대불변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범죄의 불씨가 범죄자 개인 혹은 사회의 작용 속에서 생기는 아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 결함을 메꿔준다면 범죄라는 큰 불씨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금의 희망이 공존했다.

범죄자들의 악한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치유’와 ‘협력’이 바탕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타인에 대한 비난, 증오,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제2의 셜록 홈스를 꿈꾸는 이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박수경. (2019).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pp. 35-38). 가연
이수정. (2010). 최신 범죄심리학(pp. 15-24). 학지사
김종화. (2020년 2월 4일). [과학을읽다] 프로파일링·범죄심리학·과학수사의 차이는?.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0715162401864
고예영. (2019년 4월 11일). [심리학 이야기] 범죄현장 보면 범인이 보인다··· ‘프로파일링’의 세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8768748
오지혜. (2014년 10월 25일). 범인의 범죄 행동을 심리로 파헤치다. 연세춘추.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750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750

tarasmi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