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다연
양다연
[The Psychology Times=양다연 ]
 흐릿한 사진(출처: pixabay https://pixabay.com/photos/rain-window-raindrop-water-wet-6243559/)
흐릿한 사진(출처: pixabay https://pixabay.com/photos/rain-window-raindrop-water-wet-6243559/)
앞서 말한 것처럼, 모르는 게 약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건 오히려 좋다. 강남 한복판에서 차에 치여 죽은 비둘기, 한강 편의점 쓰레기통에 바글거리는 바퀴벌레는 안 보는 게 백번 천번 만번 낫다! (경험담이다.)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근슬쩍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학생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빠르게 달려가는 차도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낫다. 보면 눈살이 찌푸러지기는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눈이 나빠 이런 장관을 놓치는 건 오히려 좋다.
사실 이런 장면은 누구나 모자이크를 하고 싶겠지만, 나만 안 보고 싶은 장면을 안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온다. 나는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에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 생각은 특히 수업을 들을 때 강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 노력한다. (조느라 실패한 적이 꽤 있긴 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워져서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 역시나 안경 벗기를 선택한다. 선생님의 시선이 내 언저리를 향할 때면 ‘이쪽을 보시는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도 질문자의 눈빛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나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 조금은 무디게 느껴진다. 면접에서 나를 조금 덜 떨게 하는 것도 청심환과 면접관의 따뜻한 미소가 아닌 흐릿한 시야다.
이것이 내가 여태 느낀 선명도 30의 매력이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반투명 벽 하나를 세워놓고 관망하듯, 방관하듯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그 벽을 부수고 망원경을 들여놓아 상대방의 모공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모든 타이밍을 정하는 사람이 오직 나뿐이었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운 것이 있을 따름인데, 반투명 벽 뒤에 사는 나는 내가 스스로 벽을 부수고 망원경을 세워두지 않으면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지 못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요즘 깨닫는다. 아직도 이런 내 눈을 바꾸고 싶진 않지만, 흐릿하게 스쳐간 지난 날들이 아쉬워지는 순간이다. 동시에 어쩌면 눈살 찌푸러지는 원인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도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후에야 가능하다는 생각도 든다.
대학생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을 상상하며 조소를 지었던 수강신청 전의 내가 생각난다. 알고보면 자신이 이 그림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띠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조소의 대상은 나였을지도...! 문득 책은 멀찍이 두고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책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듯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야겠지?’하는 의문이 아직까지도 찝찝하게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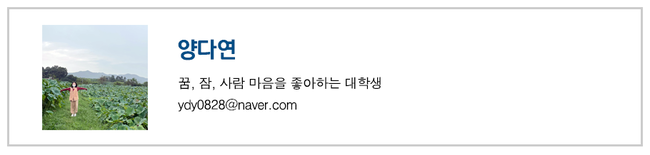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6047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6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