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경
신선경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면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흥분 시킨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량을 줄여달라 읍소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변명은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전자는 범죄 심리학에서 과시형 범죄자로 분류되는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음에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는 말을 남긴 강윤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을 언급하며 형량 감축을 요구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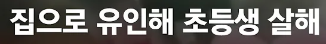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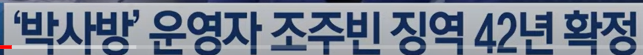
과시형 범죄자가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
양자의 범죄자들은 모두 사람의 목숨을 마치 종잇장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흔히 전자가 후자에 비해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후자의 경우 "제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와 같이 비록 반성 없는 변명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변명들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일반인들과 동일한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 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언행을 직접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만해. 나는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한거야." 또는 "더 죽여야 했는데, 아깝게 됐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후자에 비해 전자가 살인을 즐기는 듯한 악마적 본성을 더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이들을 '갱생 불가자'라고 부르며,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를 요구하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 전자의 과시형 범죄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즉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사이에 큰 본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범죄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성격적 유형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에서 인정 욕구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그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론은 과시형 범죄자들의 경악적 행태로 인해, 심신미약을 형량 감축의 근거로 악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옹호를 위해 쉽게 2차 가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시 말해, 이들의 대다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형량 감축의 근거로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실제 심리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알게 모르게 정신적 장애의 특성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는 장애적 특성을 가진 이들의 일상적 사회생활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2차 가해인 것이죠.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장애가 실제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는 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만약 관계가 없다면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 예로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 그들의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1944년 오스트리아 빈의 아동병원에서 일하던 아스퍼가가 발견한 것으로, 주위와 동떨어 지내며, 외부사회와 접촉이 차단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이들로 자폐증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언어 능력이나 지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변과 의사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 못해 고립됩니다. 그 누구보다, 일반인들보다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지만,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의 상관관계
아스퍼거 증후군은 대개 무표정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사람들로 부터 사이코패스 같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는 감정, 정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능력, 방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크게, 더 쉽게 상처 받습니다. 상처를 받았음 조차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무감각하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죠. 이는 사람들에게 아스퍼거 증후군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허나 실제로 지능이 일반인들 보다 아래를 밑도는 수준일 뿐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고 괴롭히려는 생각조차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쉽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이들이라고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짓곤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올리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장애와 범죄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 담긴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 사회에 퍼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야기 하나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듯이, 이 역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완성도 높은 드라마, 책, 영화 등과 같은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하나도, 친구들과 찍은 유튜브 영상 하나도 많은 이들과 공유하면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형성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기사
나의 아픔에 공감 받기도, 위로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폭우가 내려서 아이를 낳기 싫어요, 가뭄이 들어서 우울증이 심각해 졌어요.
참고문헌
우리는 우리 뇌다(Wij Zijn Ons Brein by Dick Swaab, 2010)/디크 스왑 지음/신순림 옮김/열린책들/2015
마음의 혼란(Ontregelde Geesten by Douwe Draaisma, 2006)/다우어 드라이스마 지음/조미현 옮김/에코 리브로/2015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905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905

shinskok@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