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윤
이도윤
[The Psychology Times=이도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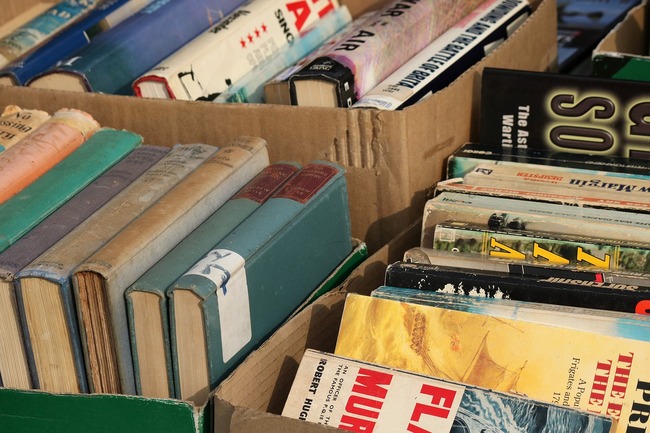
“이 물건은 8만 원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
“조금 낡긴 했지만 3만 원에는 사겠지.”
쓸모없는 물건을 중고 시장에 팔 때 종종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막상 중고 시장에 올린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여한 가치만큼 나의 물건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효과, 내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맨(Daniel Kahneman)은 1990년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코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의 실험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집단의 학생들은 그들이 소속된 대학교 로고가 그려진 머그잔을 받아 몇 분간 컵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졌다. 한편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은 머그잔을 제공받지 못한 채 현금만을 받았다. 몇 분 후, 실험진은 머그잔을 받은 첫 번째 집단에는 그 컵을 얼마에 팔고 싶은지 물었고, 현금을 받은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컵을 구매하는 데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물었다. 실험 결과, 현금을 받은 두 번째 집단은 평균적으로 2.75달러를 지불하겠다 답했지만 머그잔을 잠시 ‘소유’했던 첫 번째 집단은 평균 5.25달러를 불렀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유효과’이다.
소유효과(Endowment effects)는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보다 어떤 대상을 소유한 뒤 평가하는 가치가 훨씬 높은 현상을 말한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만족을 만들고, 사람들은 소유하게 되면 이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마케팅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흔히 옷가게에서 “한 번 입어보세요.”라는 점원의 말은 앞서 나온 사례와 동일한 심리 효과인 ‘소유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이다. 요헨 리브(Jochen Reb)는 소유효과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닌 주관적인 소유의 감정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례로 옷 가게에서 옷을 구경만 할 때보다 실제로 옷을 입어본 후에 구매 욕구가 올라간다. 옷을 입어보는 것만으로는 옷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소비자들은 옷을 입은 후에는 그 옷을 ‘자신의 것’이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입어본 옷을 사지 않는 것은 이익이 아닌 손실이라 느껴져 옷을 구매한다.
손해를 싫어하는 인간
A: 이 치료법의 개발로 200명이 살 것이다.
B: 이 치료법이 개발될 경우 600명 중 1/3이 살고 2/3가 죽는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은 A 안을 택할 것이다. 실제로 이 실험의 참가자 72%는 A 안을, 28%의 참가자는 B 안을 선택하였다.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의 이 실험은 ‘손실 회피’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손실 회피(Loss aversion)는 같은 양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양의 이득을 비교했을 때 소득 보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피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는 위험을 안으려 하지 않지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을 안으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소유효과와 손실 회피
소유한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소유효과와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는 비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원인이다.
주식을 예로 들었을 때, 대부분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서 소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다. 한편 손실을 피하고자 내린 결정이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매매 실패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여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완벽하게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비이성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측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자세를 가져보자.
참고문헌
Kahneman, D., & Tversky, A. (1981). The simulation heuristic (pp. pp-201).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Kahneman, D., Knetsch, J. L., & Thaler, R. H. (1990). Experimental tests of the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6), 1325-1348.
Reb, J., & Connolly, T. (2007). Possession, feelings of ownership and the endowment effect.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2), 107-114.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8145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8145

doyooni.lee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