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서
양현서
[The Psychology Times=양현서 ]

행복한 완벽주의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완전함에서 탈피해 완전함으로 향하는 여정은 더디기만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와중에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불안해질 때도 있다. 무엇보다 완벽해지는 과정에는 자연스레 자신에 대한 자책이 필수적인 것처럼 수반되기도 한다. 힘겨운 여정에서 내가 이룩한 것이 충분한데도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결점 하나에 집착하며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여정을 거치며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잃어버린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가혹할 만큼 자신을 몰아붙이고, 비판의 굴레로 몰아넣게 된다. 이런 자기비판적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번 기사에서는 자기비판의 문제점과 자기자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자기비판, 가혹한 자학으로 향하는 길

자기비판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에 도달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수반한다. 또한 해당 기준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결함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한 실수뿐만 아니라 생각, 외모, 행동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비관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그렇기에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부정 정서인 우울, 분노 등을 평소에 많이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비판적 성향이 극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병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발병된 정신 병리는 비사교성, 정서 억압, 학습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가 된다.
자기비판적인 사람이 부정 정서를 비교적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공 및 실패를 ‘가치의 위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 그러나 자기비판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곧 가치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후 우울감이나 분노의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자기비판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에 있어 성공과 실패와 관련된 일들을 기억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이들은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여부에 있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극받게 된다.
부정 정서의 늪에서 나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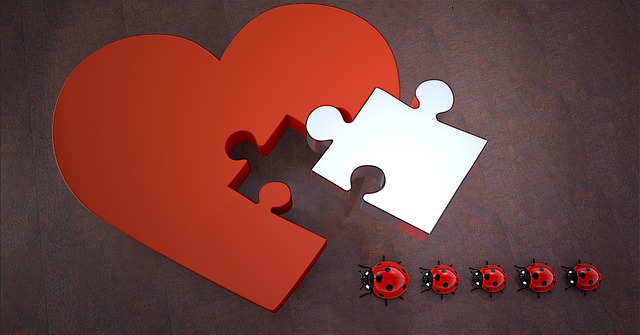
그렇다면 만약 부정 정서의 늪에 빠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자기비판적 태도에 사로잡혔다면,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 경험을 통해 부정 정서를 상소할 수 있다. 이를 ‘긍정 정서 확장 구축 이론’이라고도 한다. 해당 이론은 긍정 정서가 많은 기회를 통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주의를 넓힐 수 있음을 내포한다. 주의가 넓어지면 현재에 집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배경적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고, 또한 정서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렇기에 지나친 자학의 굴레에 사로잡혔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면에 친절을 보내는 마음이 없이 그저 채찍질하는 가혹한 마음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결국 부정 정서에 가로막히고 만다. ‘자비마음훈련’과 같이 긍정 정서를 높이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기사
(참고문헌)
조현주, 현명호. (2011). 자기비판과 우울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자비 효과. 한국건강심리학회
조현주. (2011). 한국판 자기비판/자기공격과 자기위안 형태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6606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6606

hyunseo93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