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예원
이예원
[The Psychology Times=이예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리만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리 나의 기존 의견과 달라도, 그들의 의견이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도 쉽게 나의 의견은 다르고, 당신들의 의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피력하기 어렵다. ‘타인이 보기에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동조라고 한다. 우리는 왜 동조를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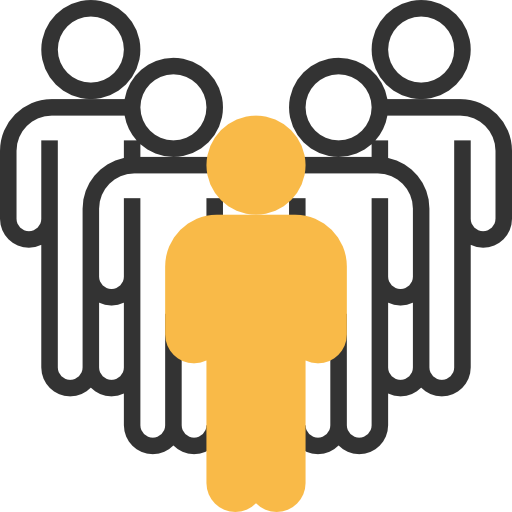
동조란?
먼저, 동조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조란 실제 또는 가상의 집단 압력의 결과로 행동이나 신념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행동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동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수용이다. 수용이란 사회적 압력과 일치하게 행동하고 믿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어떠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 순종은 사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는 암묵적 요청이나 명시적 요청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자기 생각을 밖으로는 표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의 의견이 맞는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복종이다. 순종의 하위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복종은 직접적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종은 암묵적, 명시적 요청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복종은 더 높은 지위의 누군가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동조와 복종의 증거는?
그렇다면 동조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는 뭐가 있을까? Asch가 진행한 집단 압력 연구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어떠한 명시적인 압력이 없어도 타인의 행동에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7~9명에게 동시에 선분 길이를 판단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차례로 정답을 말하게 하였다. 단, 그들 중 진짜 참가자는 단 한 명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 연구를 보조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먼저 오답을 말한 후 마지막에 응답하는 실제 참가자가 그에 동조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실제 참가자들은 처음 2회에는 정답을 말했으나 이후 12회에 걸쳐 모두 오답을 말했다.
그리고 “과학적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악명 높은 연구”라고 불리는 Milgram의 복종 실험이 있다. 해당 연구는 권력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을 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행된 것으로, 학생 역할을 하는 실험 도우미가 오답을 말할 때마다 교사 역할의 실제 참가자가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평균 135볼트 정도만 전기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65%가 마지막까지 복종했다. 명령에 저항한 사람들은 대부분 150볼트까지 전기충격을 가한 후 멈췄다. 권력자의 요구에 많은 사람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복종한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 후에 반복 검증되며 신뢰도가 향상됐다. 해당 연구는 동조의 일종인 복종에 대한 연구이기에 동조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동조하는가
사람들이 동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규범적 영향이 있다. 이에 의하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단에 수용되기 위하여 동조한다.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 호의를 사고 싶은 욕구에 의해 다수의 행동이라는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Asch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정보적 영향이다. 정확하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실재에 대한 증거를 수용하는 것으로 애매한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정보로 활용한다. 정리하면, 타인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욕구와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동조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치실은 어느 순간 사용의 중요성이 언급되며 치실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식사할 때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식사량에 비례해서 개인의 식사량이 증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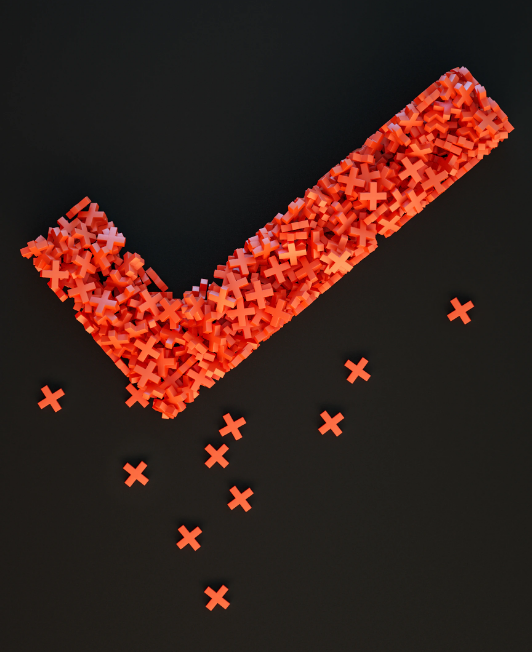
분명 동조는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너무 자기 혼자 튀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집단에서 배척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라는 걱정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집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Milgram의 연구처럼 끔찍한 결과가 실제 생활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 언젠가 소소하더라도 자기만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순간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지난 기사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참고자료
David G. Myers, Jean M. Twenge, <마이어스의 사회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20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7699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7699

ywlee22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