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이지현
[The Psychology Times=이지현 ]
 @pixabay우리의 신체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추운 곳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항상성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pixabay우리의 신체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추운 곳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몸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항상성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의 생존전략
무의식적, 생리적 작용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열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 음식을 요구하는 현상)도 있지만, 때로 우리 몸은 항상성 때문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기도 한다.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도 우리 몸은 정체기를 맞이하고, 죽어라 공부를 해도 성적의 향상이 더딜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많은 경우 이는 자기합리화로 이어진다. 이때 하는 합리화는 일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건 생각뿐
 @pixabay
@pixabay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거나 ‘나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는 자기합리화를 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몸의 항상성은 우리의 변화를 더디게 만들기에,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생각뿐, ‘인지’ 뿐이다. 이런 자기합리화는 지극히 적응적이다. 우리 뇌는, 우리의 마음은 ‘나’에 대한 저런 생각을 철수하면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철수하는 대신 우리의 기존 생각을 수정한다. ‘원래 이맘때 즘에는 살이 안 빠져’,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열심히 안 했나 보다’라는 등의 수정으로 말이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하나의 생존전략이다.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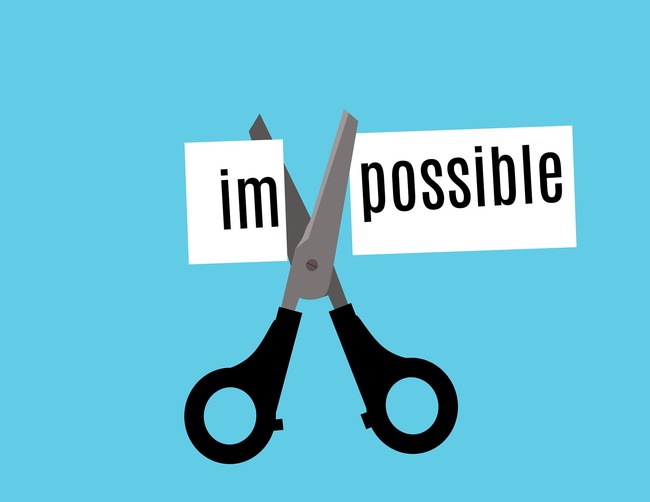 @pixabay자기합리화도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지만, 자기합리화를 택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몸의 항상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합리화’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몸이 우리 생각대로 변해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몸은 다이어트로 인해 갑자기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고,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확 잘하게 되는 상태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한편으로는 치팅 데이가 있었음에도 몸무게가 크게 늘지 않았고, 공부를 하다가 며칠 놀았는데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사실 이 항상성의 덕택 또한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pixabay자기합리화도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지만, 자기합리화를 택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몸의 항상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합리화’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몸이 우리 생각대로 변해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몸은 다이어트로 인해 갑자기 살이 엄청나게 빠지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고,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확 잘하게 되는 상태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 한편으로는 치팅 데이가 있었음에도 몸무게가 크게 늘지 않았고, 공부를 하다가 며칠 놀았는데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사실 이 항상성의 덕택 또한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신체는, 정신은 우리의 많은 것들은 대부분 항상성 때문에 더디게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
지난 기사
‘감정 과잉 시대’와 ‘무표정’
성격보다 바꾸기 어려운 것도 우리는 바꿉니다
<참고자료>
Campbell, N. A., Reece, J. B., Taylor, M. R., Simon, E. J., & Dickey, J. L. (2010). 생명과학: 개념과 현 상의 이해. (김명원 외 9인 역.). 서울: 바이오사이언스. (원저 2009 출판)
전재연, 윤영길. (2014). 배드민턴 경기에서 심리적 항상성 유지 과정. 체육과학연구, 25(3), 575-589.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368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5368

iz@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