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수
이연수
[The Psychology Times=이연수 ]
매미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된다. 초록색이던 나뭇잎이 어느새 저마다 빨갛게 또는 노랗게 물들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가을이라는 계절에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감정이 있다. 바로 “가을 타다”라는 표현이다.
이 감정은 우리가 흔히 쓰는 센티함과 비슷한 감정이다. 센티함(sentimental ; 비표준어로 센티하다라고 많이 쓴다)은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특성을 말하는 감정이다. 보통 계절로는 가을, 날씨로는 비 오는 날, 시간으로는 새벽에 많이 느낀다. 그래서 ’가을이라 센티해’, ’나 가을 타나 봐‘ 라는 말들은 자주 같이 쓰이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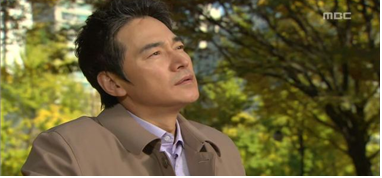
가을 탄다라는 표현은 보통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수에 차 있는 고독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통용하게 되었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감정의 과학적 이유
우선 가을 탄다라는 표현에서 그려지는 남자의 모습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미지이다. 그 전에 먼저 가을 탄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를 말하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다 보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여름(7월)에는 새벽 5시 30분 무렵에 일출이 시작해서 저녁 7시 30분이 넘어가면 일몰이 시작된다. 반면에 가을(10월)은 6시 30분 무렵에 일출이 시작해서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일몰이 시작된다. 14시간 정도 밝은 여름에 비해 2시간 반 정도 해가 줄어든 셈이다. 11월 정도가 되면 이마저도 시간이 더 줄어든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람이 햇빛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몸에서는 주로 밤에 멜라토닌(Melatonin)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의 일종으로, 마치 잠이 오는 것처럼 혈압과 심박수를 내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런 멜라토닌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가을에 분비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해가 짧아지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센티하다, 가을 탄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멜라토닌의 분비량 변화 자체는 남녀가 똑같이 오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다르다. 여자는 남자만큼 멜라토닌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는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외롭다’라고 느끼는 남자가 많지만, 여자들은 큰 변화가 없게 된다. 또한 가을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왕성하게 분비되게 되면서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더 크게 뒤숭숭함을 느낀다. 따라서 남자가 가을 탄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 여자는 가을보다는 봄을 탄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런 현상을 ‘계절성 우울증(Seasonal affective disorder)’이라고 한다.
가을에 맞서 이겨내기
그렇다면 매년 봄에는 여자들이, 가을에는 남자들이 우울감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반대로, 낮에 햇볕을 많이 쫴서 비타민 D를 많이 생성시킨다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계절감 때문에 느끼는 우울감이라면 일상 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기에 너무 큰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에 따라 두드러진 삶의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겠다. 매년 다가오는 가을이라고 해서 매번 우울감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난기사
【참고문헌】
““남자는 가을을 더 탄다.” 진짜일까?“, 나윤정 기자, 머니투데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6811
http://www.psytimes.co.kr/news/view.php?idx=6811

dal7787@naver.com